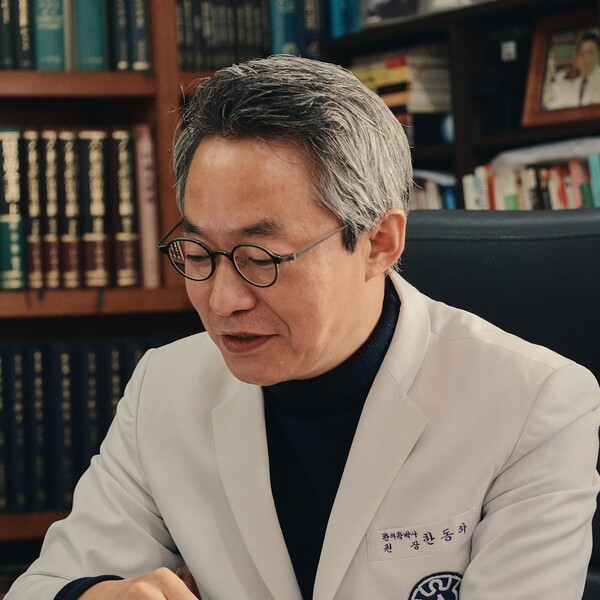
* 글쓴이 주 : 이번 칼럼부터 5회를 ‘맛의 건강학’이란 주제로 집필한다. 한의학적으로 맛은 오행의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배속되어 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자.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의지한 감각은 ‘맛’이었다. 불을 발견하기 전,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열매와 뿌리, 잎을 직접 씹어 보았다. 달면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분일 가능성이 컸고, 짜면 생존에 필요한 미네랄을 뜻했다. 쓰면 독성을 경계해야 했고, 신맛은 발효나 부패와 연결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했다.
한의학의 오미(五味) 이론은 맛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경험이 쌓여 체계화된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오미 중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신맛’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는 바로 신맛을 통해 음식을 저장하는 지혜와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웠다. 된장으로 장을 담그고, 포도즙을 오래 보관하면 술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곡물을 발효시켜 신맛이 나는 술을 만든 것은 모두 오랜 생존의 전략이었다.
맛은 단순히 미각의 쾌락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문명을 발전시킨 ‘신호체계’였다. 현대 과학은 신맛을 유기산, 아미노산, 미네랄 같은 화학물질로 분석하지만, 옛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맛을 구별해 몸과 삶에 활용했다.
신맛의 근원은 주로 유기산이다. 구연산, 사과산, 젖산, 주석산, 아세트산 등도 대표적으로 신맛을 내는 성분들이다. 레몬이나 자몽 같은 과일의 신맛은 구연산, 포도의 신맛은 주석산, 발효 식품의 시큼함은 젖산에서 비롯된다. 이들 성분은 단순히 맛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내에서 피로물질 대사, 소화 효소 분비 촉진,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생리적 효과를 가진다.
우리 일상에서 신맛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레몬, 오렌지, 석류 같은 과일, 매실청과 식초, 김치, 요구르트, 치즈 같은 발효 식품 모두 신맛이 핵심이다. 김치를 담글 때 신맛은 발효의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린 뒤 시원한 오미자차나 새콤한 열무김치를 찾는다. 이는 신맛이 침샘을 자극해 식욕을 돋우고, 땀으로 흩어진 기운을 수렴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피곤할 때 레몬즙이나 매실 음료가 당기는 것도 신맛이 중추신경을 자극해 각성 효과를 주고, 피로물질(젖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맛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할 때 자연스럽게 끌리는 생리적 본능인 셈이다.
맛은 혀의 미뢰에서 느끼는 화학적 감각이지만, 한의학에서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 인체 장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생리적 신호로 본다. 그중 신맛인 산미(酸味)는 ‘수렴(收斂)’과 ‘응고(凝固)’의 성질을 대표한다. 즉 흩어지는 것을 모으고, 새는 것을 막아 주며, 긴장을 주어 안정을 유도한다.
한의학적으로 신맛은 오행에서 목(木)에 해당하며 장부로는 간(肝)과 연결된다. <황제내경>에서는 ‘신맛은 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신맛이 간의 기능을 조율한다고 했다.
신맛은 수렴 작용이 있어서 땀, 소변, 정액, 설사 등을 멎게 한다. 그리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간은 근육을 주관해서 신맛은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켜 힘을 돋운다. 그리고 진액을 보존해서 체액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탈수나 체력 소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약재 중 신맛을 내는 대표적인 것은 작약(芍藥), 오미자(五味子), 산수유(山茱萸), 매실(烏梅) 등이다.
신맛이 나는 약재는 흩어지고 소모되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작약의 신맛은 간의 지나친 발산을 수렴시키고, 혈(血)을 보하여 간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혈(肝血) 부족, 간기울체, 간양(肝陽) 항진과 관련된 증상으로 근육경련, 생리불순, 스트레스성 두통 등에 특히 유효하다.
오미자는 땀 분비를 줄이고 기운이 나게 한다. 그리고 폐를 수렴하여 기침과 땀을 멎게 한다. 산수유는 신허로 인한 요실금이나 유정(遺精)에 자주 쓰인다. 유정은 정액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으로 소변에 뿌연 쌀뜨물 같은 것이 섞여 나온다. 이때는 떫은맛도 수렴작용이 있어서 효과적이다.
매실은 오래전부터 ‘구중해독(口中解毒)’이라 하여 갈증, 구토, 설사에 활용되었다. 참고로 매실은 불에 구워서 검게 만든 오매(烏梅)를 주로 약용한다. 오매도 신맛이 강하다. 해당 약재의 유효성분을 떠나서 만약 특정 약재에 신맛이 난다면 그 자제로 효능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약이 양면성을 지니듯, 신맛도 과하면 해가 된다. 신맛은 기운을 수렴, 수축시키므로, 지나치게 먹으면 기의 흐름이 막혀 소화불량, 복부 팽만, 담적(痰積)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근육과 인대를 과도하게 긴장시켜 쥐가 잘 나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간 기능이 왕성하여 기가 울체된 사람(예: 스트레스가 많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신맛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가 더디다. 따라서 여름철 체력이 떨어져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는 이로운 반면,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담(痰)이 많은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맛은 단순한 입의 즐거움이 아니다. 그것은 인체와 자연을 이어 주는 신호이며,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다. 신맛은 흩어진 것을 모으고,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며, 몸의 기운을 단단히 잡아 준다. 맛은 단지 혀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넘어서 음식과 약물로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유튜브에서 헬로tv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제보] 카카오톡 '헬로tv뉴스' 검색 후 채널 추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윤터뷰] 가을철 환절기, 건강 챙기려면 '이것' 먹어야
- [한동하 건강칼럼] 케데헌의 한의사는 어떻게 ‘보기만 하고’ 진찰한 것일까?
- [한동하 건강칼럼] 가을 환절기, 탈모도 계절을 탄다
- [한동하 건강칼럼] 가을철 건조한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염의 복병이다
- [한동하 건강칼럼] 가을철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난청을 의심하라
- [한동하 건강칼럼] 맛의 건강학 ② 쓴맛(苦味)은 기운을 내려준다
- [한동하 건강칼럼] 맛의 건강학 ③ 단맛(甘味)은 기운을 보한다
- [한동하 건강칼럼] 맛의 건강학 ④ 매운맛(辛味)은 기운을 발산시킨다
- [한동하 건강칼럼] 맛의 건강학 ⑤ 짠맛[鹹味]은 뭉친 기운을 풀어준다
- [한동하의 성경의학] 남녀는 갈빗대 개수가 아닌, 골반에 차이가 있다

